-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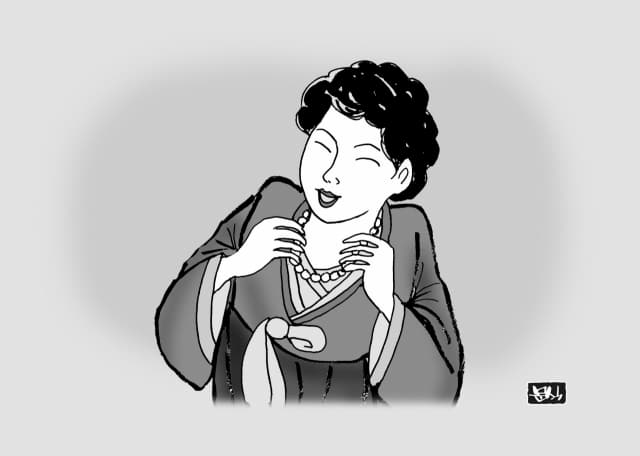
연심이 팔짝팔짝 뛰면서 좋아했다. 한여름이었다. 날씨가 푹푹 찌고 있었다. 이재영은 거리를 구경하다가 연심을 데리고 빙수가게에 들어갔다.
“아유. 진작부터 빙수를 사 먹고 싶었는데….”
연심은 빙수를 잘 먹었다. 빙수는 달고 시원했다.
“너무 맛있어요. 다음에 또 사줘요.”
연심이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연심이가 원하면 무엇을 못 사줄까?”
“미월 언니가 차를 사주었다면서요?”
“응.”
“나도 돈을 많이 벌어서 사장님 좋아하는 거 사드려야 하는데….”
“연심이는 장사나 잘해. 그러면 내가 더 예뻐해 줄게.”
이재영은 웃으면서 거리를 내다보았다. 거리에는 실업자와 걸인들이 물결처럼 흐르고 있었다. 군인들도 보였다. 이재영은 빙수가게에서 나와 시장으로 갔다. 시장에서 연심이 좋아하는 순대도 사주고 해운대 해수욕장에도 같이 갔다. 해운대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수영을 하고 있었다.
‘여기가 그 유명한 해운대인가?’
해운대는 신라 때 학자 최치원이 이름을 지었다고 했다. 조선팔경의 하나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경승지였다.
멀리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 달맞이 고개는 숲이 울창했다. 초승달 모양의 백사장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아유 시원하겠다.”
연심이 물속에서 수영을 하는 사람들을 살피면서 탄성을 내뱉었다. 사람들이 옷을 입고 바다에 발을 담그고 있었다. 옷을 벗고 수영을 하는 사람들은 드문드문 보였다.
“연심이도 가까이 가봐.”
이재영은 연심을 데리고 바다로 가까이 갔다. 이내 바닷물이 모래를 적시는 모래톱에 이르렀다.
“들어가 봐.”
“아유 어떻게 들어가요?”
연심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연심은 바다를 가까이에서 보는 것이 처음이라고 했다.
“그냥 옷 입은 채 들어가야지.”
“그래도 되나? 옷이 다 젖을 거 아니에요?”
“해가 뜨거워서 금방 마를 거야.”
“파도가 나를 삼키면 어떻게 해? 사장님이 손을 잡아줘요.”
연심이 망설이면서도 바닷물에 조금씩 발을 들여놓았다. 이재영은 연심의 손을 잡아주었다.
“아이 시원하다.”
연심은 두려워하면서도 점점 바다 깊이 들어갔다.
글:이수광 그림:김문식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2024년 04월 18일 (목)

















